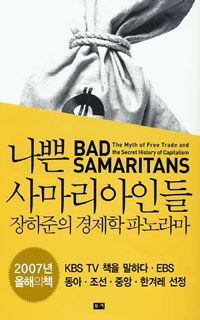경제학은 나의 오랜 꿈입니다
무슨 일을 해놓고 후회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을 본다거나 할 때
가끔 이랬더라면 하는 게 있다.
'경제학이라거나 기술을 배웠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고민도 덜하고 학문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성숙한 인간이 되었을 뻔 했다'
는 생각.
대중 경제학자들은 실로 명쾌하다.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데이터를 쓰고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텍스트들로
아 그렇구나 하는 글들을 잘도 쓴다.
인문학자들은 사실 그런 재주가 없다.
자기네들끼리 통하는 말들로 낄낄댈 뿐이지
조금만 백그라운드가 딸리는 사람이 보면
어렵다고 고개를 젓고 돌아서게 만드는 재주는 있는데.
(어쩌면 그런 걸 즐기는 지도 모르겠다.)
알고 보면 재밌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알고 보려는 용기,
지젝이나 라캉 들뢰르 헤겔의 책을
표지라도 들춰보려는 시도는
고참 앞에서 김치 뒤적거리는 것만큼이나 힘들다.
(대중들을 대상으로하는 글을 쓰는)
경제학자나 과학자들은, 참말이지 쉽게쉽게 잘도 쓴다.
물론 그렇게 쓰기까지는 대단히 오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폴 크루그먼, 장하준등을 비롯해서
내가 알기에도 여러수십명은 된다.
그렇게 쓰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지만.
그만큼을 딛고 표면에 올라온 분들만으로도
참 경제학은 경이로운 세계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나도 경제학을 배워서 도구로 쓴다면
내 생각을 훨씬 보편적이고
간단하게 전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다.
프리드리히 리스트가 그랬다더라.
"정상의 자리에 도달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뒤따라 올 수 없도록
자신이 타고 올라간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것은
아주 흔히 쓰이는 영리한 방책"
이라고.
내가 만약 불평등에 대해 설명한다고 했을때
경제학이 아닌 다른 어떤 도구가 있어
저토록 짧은 시간에 누군가의 뒤통수를 가격할 수 있었을까?
명쾌함이 부족한 나
경제학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지만
벌써 다른 전공을 해서 3학년을 반이나 했고
군대갔다오면 곧 서른이다.
이경규에게 있어 영화가 그런 것처럼
경제학은 나의 오랜 꿈일 뿐이다.